친팔레스타인 시위 뒤 지원 취소
채용 절차 중단되고 입학 정원 줄어
합격해도 학비 지원 없어 포기 속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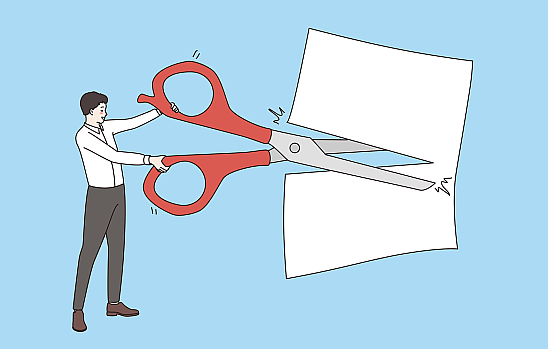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정부 예산 삭감 등을 이유로 주요 대학들에 대한 자금 지원을 멈추면서 한인 유학생 사회에도 비상이 걸렸다. 연구비 지원이 중단되고 입학생 정원이 줄어들면서 유학 중도 포기를 고심하는 학생들까지 생겨날 정도다.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의 바이오 관련 박사후 연구원에 지원한 A씨는 최근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가 국립보건원(NIH) 예산을 삭감한 탓에 아예 채용 절차가 중단됐기 때문이었다. A씨는 “최종면접까지 본 후에 내가 맡을 연구과제의 재정 지원이 동결됐다고 들었다”며 “연구분야가 (트럼프가 반대하는) 기후변화나 DEI(다양성·형평성·포용성) 정책 등과 관련이 없어 황당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취임 후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촉발된 컬럼비아대를 시작으로 주요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자금줄을 틀어막고 있다. 이달 들어선 코넬대와 프린스턴대에 각각 10억 달러, 2억1000만 달러 규모의 지원금을 취소했다. 연방정부 지원이 끊긴 펜실베이니아대는 박사과정 입학 정원을 줄였다. 이번 학기 펜실베이니아대 박사과정에 합격한 B씨는 “학과에서 예산 문제로 입학 정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통보했다”며 “다른 학교도 합격은 했지만 펀딩(학비·생활비 지원)을 해줄 수 없다고 해 초조하다”고 토로했다. 박사 준비생들은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지원받는 ‘풀펀딩’이 없으면 사실상 미국행을 포기하거나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체류 자격도 걱정이다. 국제교육자협회(NAFSA)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미국에서 비자가 취소되거나 연방정부에 등록된 체류 기록이 말소된 유학생 및 학자가 1000여명에 달한다. 연방정부 기록이 말소되면 법적 지위가
상실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워싱턴포스트는 “많은 학생이 자신의 비자가 취소됐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다”며 “정부가 대학에 학생들의 비자 취소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일부 대학은 연방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일일이 확인해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민 당국은 학생들의 친(親)팔레스타인 집회 참여나 과거 교통 위반 기록을 문제 삼아 추방하는 분위기다. 언론들은 “정부가 유학생들의 소셜미디어(SNS) 기록을 뒤져 취소 사유를 찾고 있다”고 전했다. 예일대에 재학 중인 C씨는 “혹시 몰라 지금은 안 쓰는 SNS 계정까지 찾아서 삭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버드대·브라운대 등은 외국인 학생들에게 ‘해외여행 자제’ 권고까지 내렸다. 이코노미스트는 “유학생 추방은 더는 미국 내 불법 이민자를 줄이려는 수단이 아니라 연방정부와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단이 됐다”고 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JSR] Giving Teens a Voice: Youth in Government (02/26/2026)](https://edubridgeplus.com/wp-content/uploads/2026/02/image-55-100x70.png)
![[JSR] Irvine USD Science Fair & Competition Tips (02/19/2026)](https://edubridgeplus.com/wp-content/uploads/2026/02/image-40-100x70.png)
![[JSR] TACFA Performance Inspires Young Musicians (02/12/2026)](https://edubridgeplus.com/wp-content/uploads/2026/02/image-31-100x70.png)
![[JSR] Making the Most of Summer With COSMOS (02/05/2026)](https://edubridgeplus.com/wp-content/uploads/2026/02/image-11-100x70.png)